‘문화연구’ 선구자 윌리엄스
주요 주제 망라한 문화이론 선집
루카치 총체성에 헤게모니 연결
노동계급 눈으로 대중문화 해석
주요 주제 망라한 문화이론 선집
루카치 총체성에 헤게모니 연결
노동계급 눈으로 대중문화 해석

‘문화연구’라는 새 학문 영역을 개척한 문화이론가 레이먼드 윌리엄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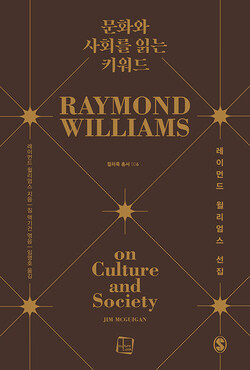
레이먼드 윌리엄스 선집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짐 맥기건 엮음 , 임영호 옮김 l 컬처룩 l 3만 3000원 영국의 문화이론가 레이먼드 윌리엄스(1921~1988)는 리처드 호가트, 에드워드 파머 톰슨, 스튜어트 홀과 함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다. 윌리엄스가 이끈 ‘문화연구’는 문화를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스며들어 있는 일상의 문화에 주목했다. 여기서 ‘일상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명제가 나왔다. 윌리엄스의 저술 활동은 출세작 <문화와 사회>(1958) 이후 <기나긴 혁명>(1961), <텔레비전론>(1974), <마르크스주의와 문학>(1977)으로 이어지며 방대한 분량을 이루었다. 영국의 문화연구자 짐 맥기건이 편집한 <문화와 사회를 읽는 키워드>는 윌리엄스의 생각이 응집된 글 20편을 뽑아 시대 순으로 묶은 ‘레이먼드 윌리엄스 선집’이다. 윌리엄스의 문화이론이 어디서 발원했는지 알려면 먼저 출신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윌리엄스는 영국의 남서부 웨일스 지역의 시골 마을에서 농촌 프롤레타리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나라에서 대로를 내는 통에 오두막집을 철거당한 뒤 도로 공사장 인부가 됐고, 아버지는 15살 때부터 철도에서 짐꾼으로 일하다가 철도 신호수가 됐다. 이 노동계급 가정에서 윌리엄스는 운 좋게 장학금을 받고 케임브리지대학에 들어가 문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에 윌리엄스는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짙게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비평가 프랭크 레이먼드 리비스(1895~1978)의 치밀한 텍스트 읽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뒤에 윌리엄스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결정론’과 리비스의 비정치적인 엘리트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두 사상의 장점을 결합해 독자적인 문화이론을 창출했다. 이 책의 맨 앞에 실린 에세이 ‘문화는 일상적이다’(1958)는 이렇게 형성된 문화관을 윌리엄스 자신의 삶과 엮어 서술하는 글이다. 길지 않은 이 글은 윌리엄스가 이후 내놓을 문화이론의 거의 모든 주요 주제를 품고 있어 이 선집의 총론과도 같은 성격을 띤다. 이 에세이에서 윌리엄스는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를 되풀이하며 ‘우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는 일상을 떠나 따로 있지 않고 인간 삶의 총체성 속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다는 주장이다. 윌리엄스는 이런 문화관과 대비되는 것으로 케임브리지대학 시절 학교 주변의 찻집에서 발견한 사례를 제시한다. 젊은 윌리엄스는 고풍스런 대학 건물이나 교정에서 위축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인근의 고상한 찻집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다고 한다. “찻집은 더 유서 깊고 품위 있는 부서 중 하나인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는 문화가 있었는데 내가 아는 그런 의미의 문화는 아니었다.” 찻집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양 있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종의 ‘기호’였다. 찻집의 사람들은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인 양 행동했다. 윌리엄스는 취향과 태도의 차이를 통해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만약 찻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화란 사소한 행동거지의 차이, 언어 습관의 미세한 차이를 의미한다고 계속 우긴다면 말릴 수야 없겠지만 무시해버려도 된다.” 이 상황은 후에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1930~2002)가 ‘구별 짓기’라는 말로 지적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윌리엄스와 비슷하게, 벽촌에서 자란 부르디외는 파리 부르주아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특성에 주목해 그것을 문화적 아비투스라는 말로 설명했다. 윌리엄스는 찻집의 고상한 문화에 맞서 자신이 어린 시절 체험한 노동자 가족의 문화를 내세운다. “우리는 집 안에 모여 곡을 연주하고 듣기도 하고 시를 암송하거나 암송에 귀 기울이기도 하며 멋진 표현에 감탄하곤 했다. 그런 곳이야말로 우리가 기대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평범한 노동자들도 문화에 관심이 있고 문화를 누릴 역량도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계속 말한다. “교육이나 예술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선의 지식을 갖추고자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모든 인간의 긍정적인 본성이다.”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윌리엄스는 이른바 ‘대중문화’라는 것을 낮추어보는 엘리트주의에 시종 비판적이다. 그 엘리트주의에는 지배계급의 보수적 엘리트주의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좌파적 엘리트주의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그 시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무지한 대중’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썼다. 대중은 무지해서 지배계급이 던져주는 아편 같은 대중문화에 젖어 산다는 얘기다. 윌리엄스가 보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런 태도는 사회적 ‘토대’가 문화라는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토대-상부구조’ 정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문화가 사회적‧경제적 토대의 영향과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대가 상부구조를 직접 규정한다는 생각은 문화 이해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 이 문제를 상술하는 곳이 다른 글 ‘마르크스주의 문화이론에서 토대와 상부구조’다. 윌리엄스는 마르크스의 ‘토대-상부구조’ 틀을 허물고 죄르지 루카치가 제시한 ‘사회적 실천의 총체성’ 개념을 수용한다. 이어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받아들여 루카치의 총체성 개념을 구체화한다. 사회를 총체로서 바라보되 그 사회를 구성하는 힘들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에는 헤게모니를 쥔 부르주아의 ‘지배하는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체제에 패배했지만 아직 살아 있는 귀족계급의 ‘잔존하는 문화’도 있고, 그 지배 문화에 맞서 일어서는 계급의 ‘떠오르는 문화’도 있다. 이 문화적 힘들이 겨루는 공간이 말하자면 대중문화라는 장이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를 질 낮은 문화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헤게모니 투쟁을 정밀하게 읽어내야 한다. 윌리엄스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당대 대중문화 현상을 깊이 분석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고명섭 선임기자 michae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