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단 데뷔 14년차 문지혁 작가
자전소설 속 ‘일상의 비일상화’
웃긴데 슬프고 겸손해서 당당해
이다지도 한 호흡에 읽히는 소설
자전소설 속 ‘일상의 비일상화’
웃긴데 슬프고 겸손해서 당당해
이다지도 한 호흡에 읽히는 소설

문지혁 지음 l 민음사 l 1만4000원 이 소설을, 놓치기 십상이었음에도, 놓치지 않아 다행이다. 오토픽션(자전소설)인 만큼 장편의 주인공 ‘1980년생 문지혁 작가’의 이력을 먼저 따라가 보자. 작가는 신춘문예에 꽤 응모했으나 당선된 적이 없다. 통상의 등단 이력이 없다. 작품 수는 꽤 된다. (문단에선 이런 작가를 ‘무면허 작가’라 부르곤 한다.) 그가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 빛을 보게 된 첫 소설(SF)엔 이런 독자 서평이 붙었다. “조잡하고 애매한 소설이며… 주제 실종에 무엇보다 더럽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가 스무살 즈음 처음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매사 “보통 일이 아니네” 속태우던 엄마를 매사 “별거 아냐” 무심하여 불 지르던 아버지조차 보통 일이 아니라는 듯 던진 말. “그래, 그럼 직업은 뭘 가질 거냐?” 아버지의 질문 덕분인지 작가는 대학 강사가 된다. 대한민국 여느 강사처럼 1시간 4만5000원을 받으며 소설 창작을 가르친다.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1898)을 교재 삼기도 한다. 위선적 인물 구로프는 구 ‘프로’나 되는 듯 바람을 피우고 다니다 젊은 유부녀 안나를 만나 마침내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불륜을 미화해 불쾌하다’ ‘소설 자체가 역겨웠다’는 근래 대학생들에게 강사가 문학의 의미를 더해본다. “소설이란 윤리로 비윤리를 심판하는 재판정이 아니라, 비윤리를 통해 윤리를 비춰 보는 거울이자 그 둘이 싸우고 경쟁하는 경기장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이 안나의 이야기를 써야 할 때(예요)” 한 학생의 이윽고 종강 평가. “여혐 가득한 빻은 텍스트를 골라 놓고서 변명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수업.” 이쯤 되면 궁금할 만하다. 소설을 쓴 문지혁 작가와 소설이 된 ‘문지혁 작가’는 어디까지 일치할까. 명확한 건 플롯이 생애와 열차 궤도처럼 일렬 지어 있다는 점이고 그때 중요한 건, 그 궤간 거리일 거다. 일기에 쓰여진 당신이 일기를 쓰는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삶이질 않는가. 문지혁 작가는 ‘문지혁 작가’에게 말했다. “나도 나지만, 더 안 풀린 지혁이다. 좀 더 가혹하게 내몰았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한겨레>와의 8일 전화 인터뷰) 하지만 어느 문지혁도 자기비하나 좌절로 점유되지 않는다. 정결한 문장과 기만을 배제한 기교적 구성으로 당도한 지점은 이렇게 서술되어야 맞겠다.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고 경쾌하나 들뜨지 않고, 웃긴데 슬프고 겸손해서 당당한 40대의 성장소설. 이다지도 한 호흡으로 읽힌 소설이 근래 있나 싶다, 하나의 장르처럼. 2010년 단편 ‘체이서’와 함께 작품 활동을 시작한 문 작가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 <중급 한국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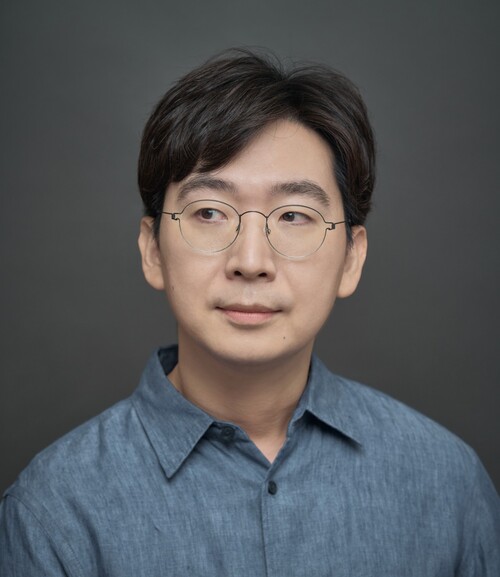
2010년 데뷔한 문지혁 작가. ⓒ윤관희, 민음사 제공
후기 나무들 잘라 소설을 내야겠냐
문지혁 작가는 2010년 첫 책을 낸 뒤 한동안 자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등단하지 못한 데 따른 “열등감”이라고 했다. 수차례 도전했을 뿐 아니라, 등단하려는 후학에게 글쓰기 비법을 가르치는 이질 않은가. “계속 쓰지만 비평적으로 조명되지도, 팔리지도 않는다면 나무들 잘라 책 만드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소설 그만 쓸 각오로 문학상 응모한 작품이 <초급 한국어>지만, 낙선했다. 당시 문 작가는 이미 데뷔 10년차. “부끄러워서” 출강하는 대학들의 이름 한 자씩을 따서 ‘한동원’이란 가명으로 응모했다. <중급 한국어>에서 유머가 각별한 이유는, 자신의 ‘일상’을 ‘비일상’으로 과장하거나 연민하지 않는 장치로도 구현되는 덕분이다. 현실 속 작가와 소설 속 작가의 궤간, ‘일상의 비일상화’를 꾀하는 듯 일상과 비일상의 거리를 유지해내는 장치랄까. “계량화는 어렵지만 이야기의 50%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다음은 모두 진짜다. “(지난 시절) 문단 바깥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비평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공평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마지막 작품이라며 썼던 <초급 한국어>부터 비평을 해줬다”는, “최근 몇 년은 등단, 비등단의 문턱이 희미해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작가·교육자로서의 말. 문 작가는 지난해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을 받았지만, 이번 책 작가정보에서 수상이력을 일부러 뺐다고 했다. 매주 쏟아지는 신간 사이에서 이 소설을 놓치지 않아 다행이다. 수상작품집도 읽었던 나 자신을 얼마나 책망해야 했을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