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원년’ 신춘문예 등단
고명재 시인 첫시집의 새해 위로
“절실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픔도 죽음도 이토록 낭랑히
고명재 시인 첫시집의 새해 위로
“절실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픔도 죽음도 이토록 낭랑히

고명재 시인. 문학동네 제공

고명재 지음 l 문학동네 l 1만원 1월 새 문사의 호명 없이 어느 새해도 오지 않았다. 고명재 시인도 3년 전 이맘때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그의 첫 시집인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이 문학담당기자에게 송달된 건 지난달 중후반, 한 차례 읽다 도중 관두었다. 연말연시 기획들로 지면이 좁았고 어떤 시는 난해했다. 그럼에도 매인 듯, 밀치진 못한 채 세밑 주말 쥐고만 있다… 재차 읽었다. 한 시편의 적요함 때문이다. “연의 아름다움은 바람도 얼레도 꽁수도 아니고 높은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나를 배고 엄마는 클래식만 들었다 지금도 소나타가 들리면 나의 왼손가락은 이슬을 털고 비둘기로 솟아오른다 나는 반쯤 자유 반쯤 미래 절반은 새엄마 내가 행복해야 당신의 흑발이 자라난다고 거대한 유칼립투스 아래에 누워 잘 지내고 있다고 전화를 건다 사랑은? 사랑은 옆에 잠들었어요 연인의 두툼한 뱃살에 귀를 얹은 채 행복의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이곳이 눈부시다고 말한다 그때, 혼자 떨고 있었던 거지 병원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던 거지 이상해 배꼽 주변이 자꾸 가렵고 고압선을 보면 힘껏 당기고 싶고… 내가 이곳에서 새 삶을 사는 동안 엄마는 암을 숨기고 식당 일을 했고 나는 밝은 새소리로 이곳의 풍경을 노래하면서 남반구의 하늘에 대해 말했다”(‘청진’ 부분) 질기구나, 그 탯줄은, 여낙낙히. 탯줄은 최초의 연이라, <율리시스>(제임스 조이스)대로라면 마침내 모든 이의 과거와 오늘의 우리를 연결한다. 시인에겐 반과 반, 여기 거기, 명과 암을 잇고 죽음과 삶을 연결한다. 저 멀리 연의, 얼레로 전해 받는 입질이 바람 탓이겠는가. 아마 슬픈, 죽은, 거기 다 사라지지 않은 기억의 신호이고 몸짓일 거다. 시인은 1987년 대구 출생으로 계명대 문예창작학 강사다. 이성복 시인이 교수로 있던 데다. 빠른 등단은 아닌데 시 전반에서 ‘드러내기’보다 ‘감추지 않음’이 견지되는 태도이고, 이는 반대로 오래 감춰 담금질했을 삶의 내력을 묻게 한다. 가령 스님 품에서 한때 자랐거나 궁핍했다거나. 기실 시보다 더 올돌히 드러나는 것은 곡진한 시적 태도다. ‘비장하자’가 아니다. 그는 웃고 있다, 여낙낙히. “가장 아름답게 무너질 벽을 상상하는 것/ 페이스트리란/ 구멍의 맛을 가늠하는 것/…/ 나는 안쪽에서 부푸는 사랑만 봐요/ 불쑥 떠오르는 얼굴에 전부를 걸어요/…”(‘페이스트리’ 부분)에서 감추지 않는바, 낭랑히 그는 불쑥 떠오르는 얼굴에 모든 걸 걸고자 한다. 시가 스스로에게 구원이었기 때문일까. 그렇담 당신에게도 구원이 되리라 보는 걸까. 비장하자가 아니다. 그는 웃고 있다. “그때 나는 돌아다니는 환대였으므로/ 개와 풀과 가로등까지 쓰다듬었다// 그때 나는 잔혹했다 동생과 새에게/ 그때 나는 학교에서 학대당했고/ 그때 나는 모른 채로 사랑을 해냈다/ 동생 손을 쥐면 함께 고귀해졌다// 그때 나는 빵을 물면 밀밭을 보았고/ 그때 나는 소금을 핥고 동해로 퍼졌고/ 그때 나는 시를 읽고 미간이 뚫렸다/ 그때부터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때의 네가 창을 흔든다/…”(‘소보로’ 일부) 창을 흔드는 이들 중엔, 사회적 죽음들(‘북’)이 있다. 합천 원폭피해 할머니들(‘그런 나라에서는 오렌지가 잘 익을 것이다’)이 있다. 할머니와의, 어머니와 다름없던 비구니승과의 작별이 있고, 떠난 개, 먹었던 나물, 빵도 있다. 이 기억들을 연줄로 붙들고 함께 흔들리는 시인의 마음, 그래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마음은 이렇게 노래 되는 모양이다. “죽은 씨앗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거야 나무가 다시 자라길 기도하는 거야 소네트 같은 거 부모 같은 거 고려가요처럼 사라진 채로 입속에서 향기로운 거// 열매는 한여름 빛의 기억이라서 태울수록 커피는 반짝거리고 그 기억을 마셨으니 잠들 수 없지 불에 덴 것들은 최선을 다한다 불꽃, 파프리카는 탈수록 달달해진대 불꽃, 유기견은 눈동자가 필름 같더라 불꽃, 우리가 계속 찾아다닌 건 불에서 꽃을 건진 그 눈이다”(‘아름과 다름을 쓰다’ 부분) 불에 덴 이는 사력으로 “타버릴 이름”의 다 탈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자 한다. 다만, “가장 투명한 부위로 시가 되는 것/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미래가 빛나서/ 눈 밟는 소리에 개들은 심장이 커지고/ 그건 낯선 이가 오고 있는 간격이니까/ 대문은 집의 입술, 벨을 누를 때/ 세계는 온다…”(‘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에서야 감추고 있는바, 코앞에선 눈도 뜰 수 없게 빛나는 그 귀한 존재들은 이제 오지 않고, 영영 입 맞출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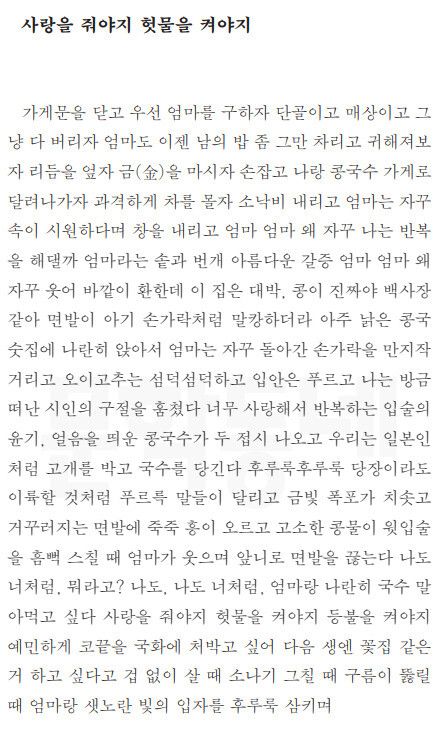
시의 풍경. 고명재 시인의 ‘사랑을 줘야지 헛물을 켜야지’. 시집 갈무리
후기 시인의 모순은 모순이 아니다
고명재 시인은 잘 웃었다. 잘 운다고 했다. <한겨레>에 지난 3년 시집을 준비하며 “비겁하고 약한 사람인데, 살아가는 자로 계속 기억하고 감당하는 일을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쓰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 등단 전후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더 즐겁게 눈치 안 보고 써서 대부분 등단 뒤 쓴 시들로 구성했다”고도 말했다. ‘그대’가 안 보아도 괜찮다였다.
그러다 “요즘 시는 어려워, 안 읽고 싶어, 해석되지 않아 많이 말한다. 너무 아쉽다. 지하철 장애인 시위도 그렇고 왜 저들이 힘겹게 저 언어를 발산하는지 해석하려는 데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말했다. 이 모든 ‘모순’은 그의 시에서 모순되지 않는다. ‘불쑥 떠오르는 얼굴에 전부를 거’는 시의 원칙 때문이다. 조사해보니 2020~22년 전국종합일간지로 등단한 22명 시인 가운데 시집을 낸 이는 셋, 이제 넷. 귀한 원칙 또한 적어도 넷이겠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