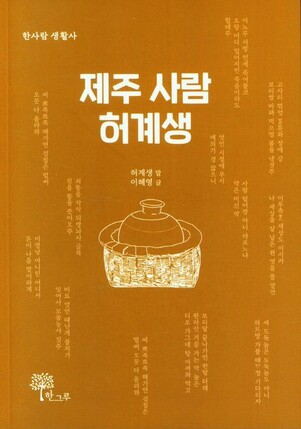
허계생, 이혜영 지음 l 한그루 l 1만6000원 “삶인지 죽음인지 그러며 살았지. 너나없이 다 그처럼 사니까, 뭐 좋은 세상 알았어?” 계사년(1953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계생이란 이름을 얻게 된 제주 여성의 인생사는 한국 현대사의 큰 소용돌이와 궤를 함께 했다. 허계생의 조부는 4·3 때 숨졌고, 넉넉했던 집안은 가난에 빠졌다. 동시에 매일의 생활엔 제주 여성의 특수성이 깃들었다. 열살께 작은 물허벅을 지기 시작했고, 스무살에 결혼해 농사를 짓고 장사도 했다. 덜컥 생긴 아이를 떼보려는 노력도, 의처증 있는 남편이 “언제 죽어불코” 기도하는 나날들도 있었다. “내 세상”은 누군가에겐 조금 늦게 열리기도 한다. 몸 안의 화가 병이 됐을 때 의사로부터 “소리 지를 수 있는 델 다녀보라”는 말을 듣고 반백살에 처음 배운 소리에서 허계생은 재능을 발견한다. 평범한 이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에 절로 응원을 보내게 된다. 작가 이혜영은 ‘표준어 번역본’을 제주말과 분리해 배치하기를 거부했다. “제주말을 쉬이 넘겨버리고 번역한 말만 읽게” 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 육지사람이라고 해서 제주 방언의 독특함을 모르지는 않겠으나, 고스란히 인쇄된 글과 괄호 안의 작은 표준어를 병행해 ‘읽어내는’ 작업은 새로운 독서 경험을 준다. 눈을 바삐 굴리며 괄호 안의 표준어만 읽으면 되지 않느냐고? 책은 한번 설명해준 제주어를 다시 일러주지 않는다. 성실하지 않았다간 몇 번이고 책장을 다시 들춰야 할지도 모른다. 책엔 짧게나마 입말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큐아르(QR)코드도 있는데 소리는 글보다도 낯설다. 그 모든 생경함을 천천히 곱씹을 것을 추천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민중미술 어머니? ‘보헤미안’ 케테 콜비츠도 있다 [책&생각] 민중미술 어머니? ‘보헤미안’ 케테 콜비츠도 있다 [책&생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1223/53_16717565347193_20221222503827.jpg)
![[책&생각] 시인 김남주가 다시 물었다, 보리는 왜 밟혀 더 푸른가 [책&생각] 시인 김남주가 다시 물었다, 보리는 왜 밟혀 더 푸른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1223/16717575375986_20221222503848.jpg)
![2023년엔 달라진 ‘그 다음’이 필요하다 [책&생각] 2023년엔 달라진 ‘그 다음’이 필요하다 [책&생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1223/53_16717552176981_2022122250387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