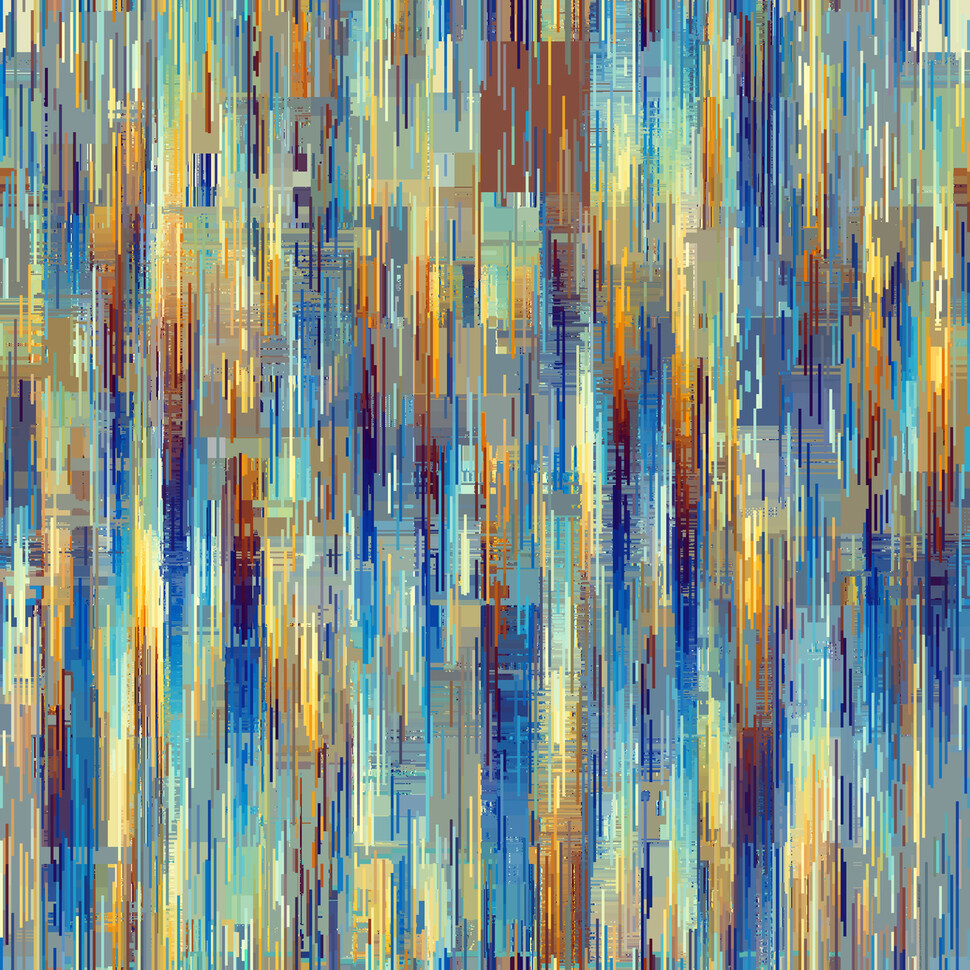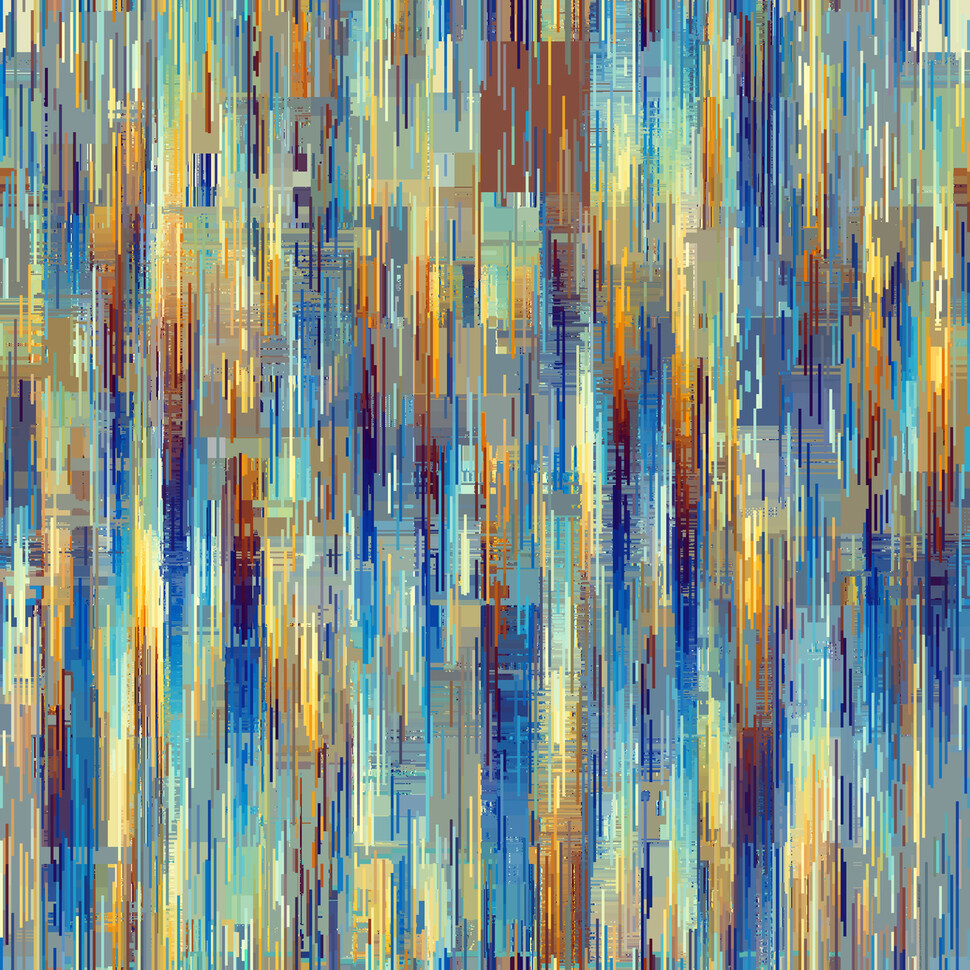‘글리치’를 동반한 벡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문명에서는 뭐든 늘 새것처럼 반짝이며 그럴듯해 보입니다. 0과 1만으로 이뤄진 디지털 제품들은 먼지가 앉지도 때가 타지도 않으며, 마치 영생이라도 할 듯 늘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색이 바래지거나 낡아 바스러지지 않는 디지털 사진, 테이프처럼 늘어날 일 없이 깔끔한 디지털 음원, 시간이 지나도 열화 현상 없는 디지털 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덕에, 그것을 담아내는 낡은 기기들이 여러 차례 교체되는 과정에도 데이터로 이뤄진 디지털 제품 그 자체는 정말로 ‘구름 위’에서 내려온 듯 언제나 생생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 디지털 문명이란 것도 어쩌면 ‘그럭저럭, 대충’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로 착각하여 제시된 사진 추천 등 신뢰하기엔 미심쩍은 알고리즘, 국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 간혹 띄워지는 조악한 번역의 한국어 메뉴, 그 누구도 원인을 결코 알 수 없을 접속 지연이나 오류, 나도 모르게 망실되고 마는 하드디스크 속 자료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에 간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어쩐지 역부족인 모습 같달까요.
끝없이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되레 적당히 쓰고 버려지는 것들만 만드는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 <디컨슈머>를 읽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우리 주변이 단시간에 그럭저럭 쓸 만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건 거기에 드는 인건비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할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지, 새삼 다시 생각해봅니다.
최원형 책지성팀장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