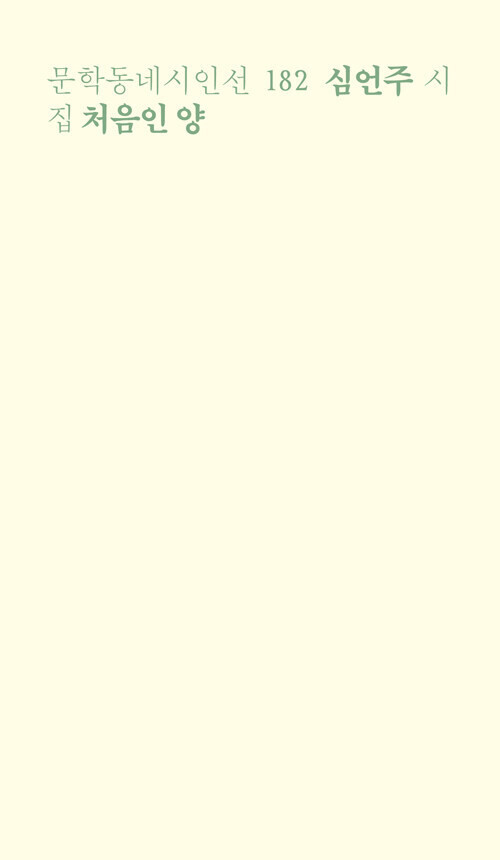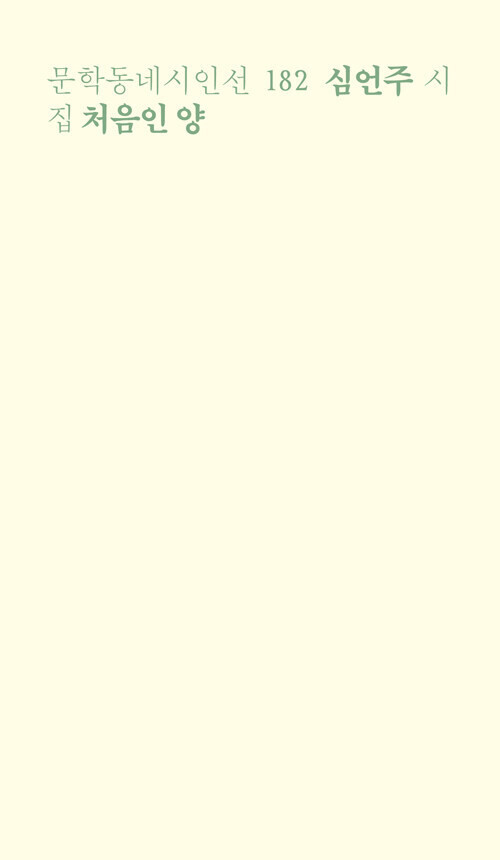처음인 양
심언주 지음 l 문학동네 l 1만원
권두언(‘시인의 말’)이 “염치에서 서울까지/ 나였던 나를/ 내가 아니었을 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를/ 나와 함께/ 때로는 너와 함께/ 밀고 가는 중이다”이다. 그러니 심언주 시인의 새 시집을 읽는다는 건 제목대로 <처음인 양> ‘염치’라는 곳부터 다녀가는 일이겠다.
(충남도에 있는) 소금고개 염치에서 “나는 한없이 투명해져서 이전에 내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모르겠”다면서도 “비가 와도 염치는 없어지지 않”고 “주소를 적을 때 잘못한 일도 없이 부끄러워/ 종이를 뒤집어놓고만 싶고/ 뒤집어놓아도 간이 밸 것 같아서” “염치는 내게 밑간이 되고 신념이”(‘염치읍민입니다’ 부분) 된다.
존재의 기억 이전 이미 밴 ‘부끄러움’이 염치이고, 시는 결국 이 부끄러움의 고갯길 넘는 삶이다. “양은 처음 보아요” 말하는 딸처럼 어떤 부끄러움은 처음이고 “처음이라 말하는 순간 처음은 사라”지는 것인데 부끄러움은 (아이에게) ‘처음인 양’처럼 “뭉치면 한 마리”였다 “흩어지면 백 마리”로 또 오게 마련이다.
시인은 이러한 삶을 지나치게 훌닦지 않는다. 시인인 ‘체’ 안 한다. “정말을 어디에 둘까 고민하는데 둘 곳이 없”고 “누굴 줄까 고민하는데 사람이 없”고 “절망의 가장자리를 떼어내고 떼어내고/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데 정말이 시든다”는 것(‘정말을 줄까 말까’ 부분)이니까. 가만히,
멈춰본다. “바닥은 엎드린 채/ 지금 나는 바닥일까 생각한다.//…// 바닥은/ 자주 기준이 바뀐다.//…”(‘파닥파닥이 지치면 바닥이 된다’ 부분)
누워본다. “…// 나는 당신의 가장자리/ 당신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 다행의 가장자리// 누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자리/ 밤이 필요한 자리”(‘수평선’ 부분)
서보다 말고. “…두부는 잘 견딘다 두부도 없고 둔부도 없으면서 두부는 서 있다 엎드려 있다 누워 있는 두부의 하얀 속살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필요할 때 각을 세울 줄 안다/…그러다가 두부는 자책하며 무너진다… 두부는 두부 밖으로 밀려나온다/…”(‘이기려고 두부가 되는지 져서 두부가 되는지’ 부분)
말해본다. “어떻게 될지 몰라// 웅크린 채 몸을 말고 있다보면// 부풀 수 있대.// 속이 꽉 찬 소시민이 될 수 있고/ 위기마다 일어설 수도 있대.//…// 뜯을 때보다/ 뜯길 때가 더 마음 편한 거래.// 햇볕에 부푼 낙타 등을 어루만지며/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식빵을 기다리는 동안’ 부분)
어떤 고개도 결코 치고 오르자는 법이 없다. 횡으로 흔들흔들. 심언주는 이 작고도 맛깔난 위로들의 발견을 위해, 시인의 소명인바, 흔하디흔한 ‘말’을 툭하면 흔들고 턴다. 어렵게 말하자면, 자간이 해체되어 숨겨둔 말의 본질과 풍경이 드러나고, 낱말이 으깨지고 다져져 밑간이 드러나는 격이다.
“길어진 두 팔에 매달려/ 그네 하고 부르면/ 당신은 그래그래 대답하면서/ 앞뒤를 살펴요/ 길어지는 당신이/ 이유가 길어지는 당신이/ 나를 흔들어요”(‘그래그래’ 부분) 그렇게 고갯길 너머로.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