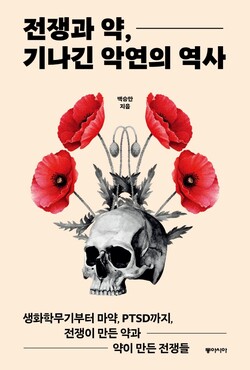
백승만 지음 l 동아시아 l 1만7000원 ‘마법의 탄환’ 또는 ‘매직 불릿’(magic bullet). 전세를 일거에 뒤집는 무기, 작전, 지휘자를 뜻하…지 않는다. 페니실린과 살바르산에 대한 헌사. 19세기 말 아프리카 식민지배에 뒤늦게 나선 독일의 선택지는 더한 오지. 더 혹독한 풍토병과 다투다 개발한 인류 최초의 합성 매독 치료제가 살바르산(1910년)이다. 비소가 원료였고, 매독균만 골라 사멸시키는 세포염색 기술이 원리였다. 최초 항생제 페니실린의 이야기는 좀 더 길다. 1928년 플레밍이 우연히 찾았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한 푸른곰팡이균 페니실린을 2차대전 중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항생제 효과를 기대하며 고순도로 정제하는 데까지 성공한다. 1943년 패혈증으로 죽어가던 40대 남성에게 임상투여해 하루 새 열과 종기를 눌러 앉히고 식욕을 일으켜 세웠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으나 환자는 달포 뒤 죽는다. 페니실린이 모자랐다. 또 하나의 열강 프랑스도, 중립국을 선언했던 소강국 네덜란드도 그러든 말든 애저녁 함락되고, 홀로 독일과 맞서던 영국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때부터의 원천기술, 해외 식민지 따위를 제공하던 차다. 옥스퍼드 연구팀도 연구결과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 나라의 자본과 기술로 ‘배양’되어 마침내 대량생산 체제를 맞는다. 1943년 미국 ‘전략물자 연구’ 중 페니실린보다 우선한 건 원자폭탄뿐이었고, 그 페니실린은 이듬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규모 보급된다. 그리고 종전도 전인 1945년 3월 페니실린 생산과 전승에 자신 있던 미국은 민간에도 개방한다.

“고마워요, 페니실린. 그가 돌아올 거예요!” 페니실린으로 부상병이 치료받는 그림. 페니실린은 독일군에겐 없는, 연합군의 비기 구실을 톡톡히 했다. 동아시아 제공

스페인 독감을 크게 확산시킨 곳으로 지목되는 1918년 미국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 신병 훈련캠프. 1차대전 참전을 결정한 미국은 훈련소에서 신종 감기에 걸린 병사들을 결국 유럽 전선으로 파병한다. 당시만 해도 독감을 ‘균’에 의한 질병으로 보았다. 술이 독감 예방에 좋다는 광고까지 나온 배경이다. 균과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동아시아 제공

미국 남부전쟁은 원시적 기관총의 등장으로 사상자가 급증했다. 초기 수면제로 사용되다 이 전쟁서부터 진정제로 부상병에게 널리 사용된 모르핀으로 중독자들도 크게 늘었다. 2차대전과 달리 적정량에 대한 지식과 통제가 없던 탓이다. 마약에 중독된 이를 ‘군인병’이라 부르며 풍자한 당시 만평. 동아시아 제공

수술 중 사망 원인으로 균 감염을 의심하며 영국 스코틀랜드 외과의사 조지프 리스터는 1860년대 페놀을 활용한 살균수술법을 시도했고, 1880년대 독일 로베르트 코흐는 세균을 질병의 원인으로 증명한다. 미국은 리스터의 이름을 따 구강소독제도 출시한다. 리스테린이다. 일본의 카레라이스는 1880년대 제국주의 첨병 구실을 한 자국 해군에게 각기병(비타민B 결핍)이 걸리지 않도록 고안된 식단 중 하나로 대중에게까지 퍼지게 됐다. 동아시아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