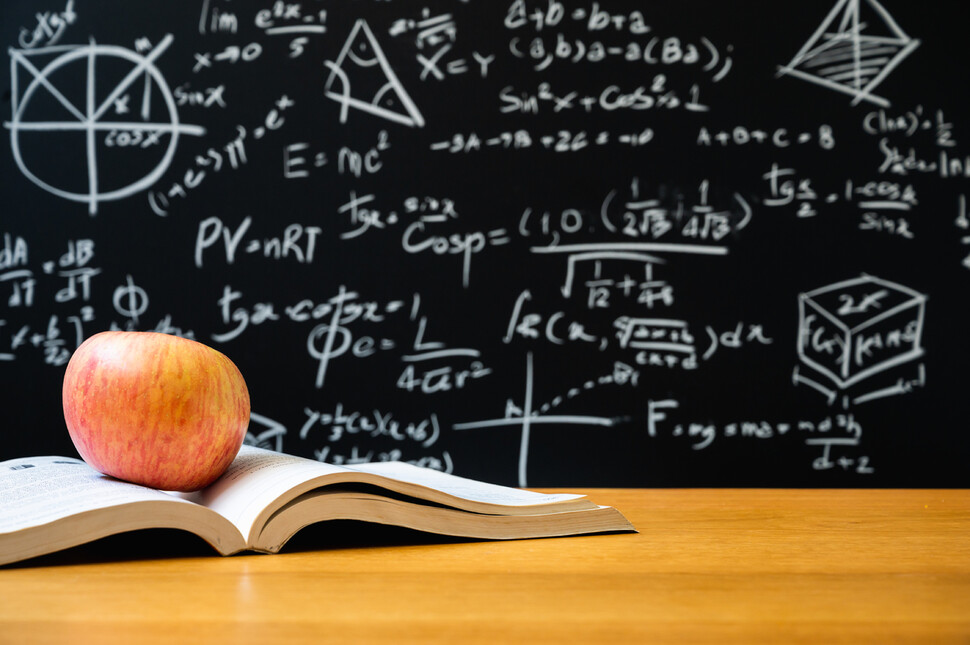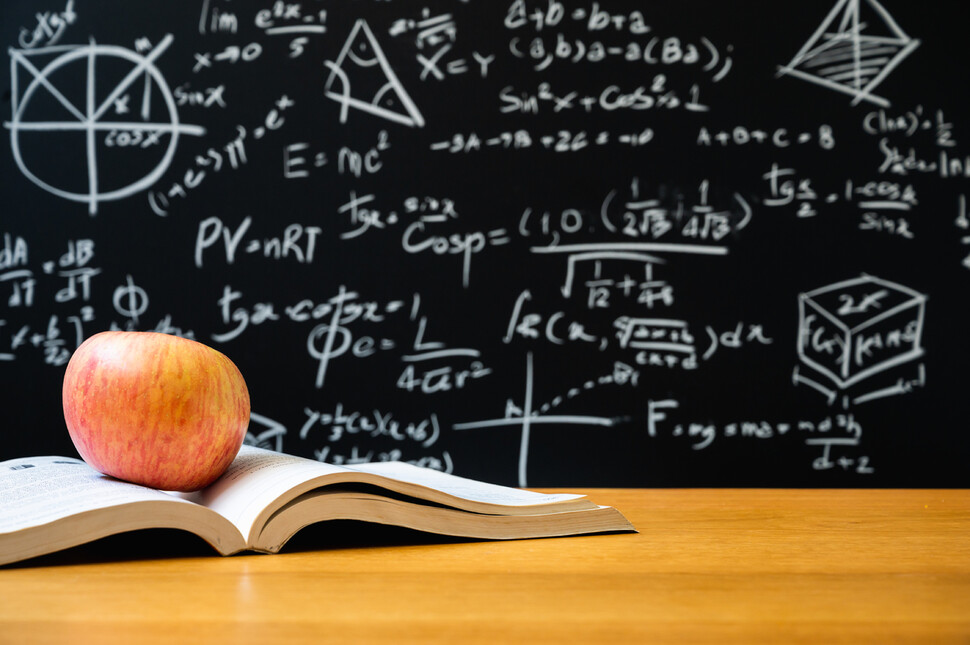중학생 때 40점대 성적표를 잇따라 받아든 뒤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했지만, 영화나 소설 같은 대중문화를 접하며 ‘수학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따위의 공상을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대상의 비밀을 풀어낼 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는 방법으로 흔히 수학이 제시되곤 하니까요.
영화 <콘택트>에서 천문학자인 주인공은 소수(prime number) 개념을 통해 외계로부터 날아온 전파 신호가 자연계의 것이 아닌,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임을 포착합니다. 공상과학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태양계 밖으로 나간 과학교사 주인공은 모든 것을 계산해보는 습관 또는 계산해내는 능력으로 눈앞에 닥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밀폐된 공간 속 중력가속도를 계산해 자신이 지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치기도 하고, ‘지구보다 29배 높은 기압 조건 아래에 살고 6진법을 쓰며, 지구의 2.366초가량을 1초로 삼는다’ 등의 계산을 통해 인류 최초로 만난 외계인과 차근차근 의사소통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대중문화 속에서 제시되는 모습들은 수학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일부이거나 그런 일부의 과장일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이런 식의 얕은 재현에도 나름대로 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암시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존재라는 울타리 밖, 그러니까 타자를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 바로 수학이라고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타자, 곧 외계인을 만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수학일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원형 책지성팀장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