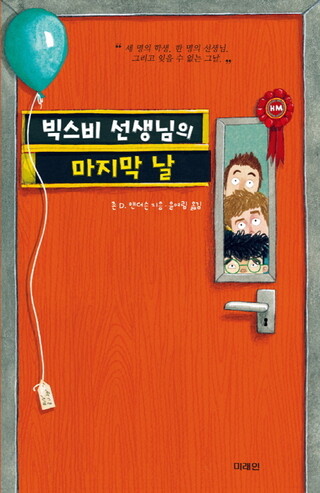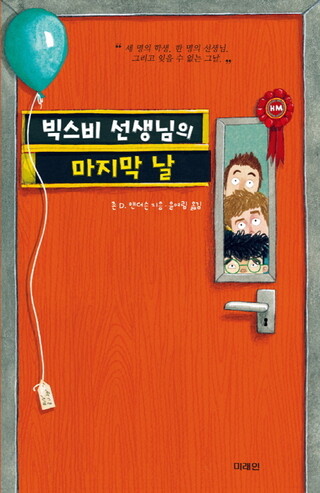[한겨레Book] 한미화의 어린이책 스테디셀러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
존 D. 앤더슨 지음, 윤여림 옮김 l 미래인(2019)
이렇게까지 많이 울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심지어 절반까지는 깔깔거리며 읽었다. 슬픈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제대로 슬픈 작품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씻겨 내릴 만한 진정성이 느껴져야 눈물이 나오는 법. 책을 읽으며 내 인생의 빅스비 선생이 떠오른다면, ‘문득 돌아보는 순간’과 눈물이 찾아올 테다.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은 세 명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병원에 입원한 빅스비 선생을 만나러 가며 겪는 말도 안 되는 모험을 그린다. 좀 별난 구석이 있던 빅스비 선생은 마지막 학기를 겨우 4주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췌장을 공격하는 암의 일종인, 췌관선망종 진단을 받은 것. 입원하기 전 마지막 파티를 약속했지만 취소되었고 곧 큰 도시의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다. 결국 토퍼, 스티브, 브랜드는 학교를 몰래 빠지고 선생을 만나러 간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것저것을 사느라 번잡하다. 먼저 미셸 베이커리에 가서 ‘화이트 초콜릿 라즈베리 슈프림 치즈케이크’를 구입하고, 헌책방에서 <호빗>을 챙긴다. 와인도 필요하단다. 술을 살 수 없는 미성년자이니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남자에게 구입을 부탁한다. 하지만 아뿔싸, 아이들이 와인을 고르는 사이 남자가 돈을 들고 튀었다. 도망자를 쫓다 토퍼는 발목을 접질리고 가방에 넣은 치즈케이크는 곤죽이 되어버렸다. 이 계획을 세웠던 브랜든은 선생을 만나러 가는 걸 포기하려 든다. 대체 아이들은 무슨 꿍꿍이인 걸까.
아이들에게 빅스비 선생은 특별한 분이었다. 한마디로 ‘학교라는 고문을 견디게’ 해주는 좋은 선생이었다. 언제나 칠판에 책에서 읽은 말들(일명 빅스비어)을 적어 주었다. “지구에서 머무는 날이 딱 하루 남아 있다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같은 짧은 글쓰기 주제를 내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써보게 했다. 또 간달프나 빌보 같은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호빗>을 읽어주었다. (겨우 20페이지밖에 안 남았는데 선생은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빅스비 선생은 결국 서른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단언컨대 아이들은 평생 선생을 기억할 테다. 혼자 무거운 삶의 짐과 맞서고 있던 브랜든을 눈이 쌓인 거리에서 발견해주었고, 토퍼가 그리고 버린 그림을 주워 ‘꿈의 파일’을 만들어주었고, 성적을 따지러 온 스티브의 아빠에게 ‘아드님은 성장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해주었으니까. 아이들은 배웠다. “살아가면서 문득 돌아볼 수 있는 날들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날들은 마치 카네이션 꽃 같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 한다”는 걸 말이다. 그런 마지막 순간을 선생에게 만들어주려고 길을 떠난 거다. 스포일러라 참지만 끝까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그나저나 내일 아침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을 것 같다. 초등 6학년 이상.
출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