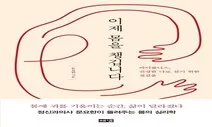[한겨레BOOK] 이주혜가 다시 만난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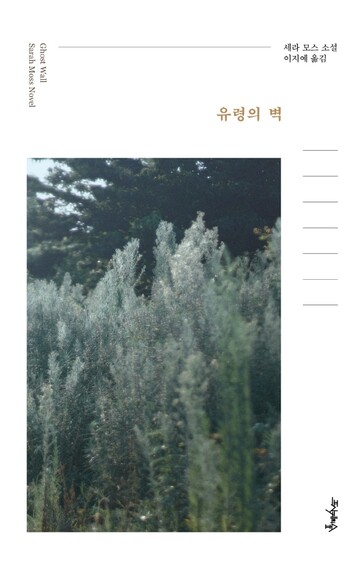
세라 모스 지음, 이지예 옮김 l 프시케의숲(2021)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어느 더운 여름, 잉글랜드 북부 습지대에서 2천년 전 철기 시대의 생활을 재연하는 캠프가 열린다. 소설의 화자인 열일곱살 실비와 그의 부모, ‘체험 고고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셋과 지도교수까지 일곱명의 캠프 참가자는 튜닉을 입고 모카신을 신고 들판과 습지를 다니며 토끼를 사냥하고 야생 식용식물을 채취해 먹을 것을 마련한다. 그 시대의 생활이란 곧 생존을 의미하고 생존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죽여야만 가능하다. 실비는 맨손으로 야생 우엉을 파내면서 ‘우엉을 죽이면서 토끼 내장을 제거할 때보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고 ‘삶이란 전부 해를 끼치는 것’이며 ‘우리는 죽임으로써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고대의 생활은 당연히 불편을 전제로 하지만 그 불편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다. 여자들은 배설과 목욕 등 기본적인 일조차 누구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실비는 개울에서 속옷을 벗고 목욕하다가 아버지의 눈에 띄는 바람에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로 숲속에서 가죽 벨트로 매질을 당한다. 잉글랜드 북부는 한때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며 광산업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쇠락한 지역이다. 실비의 아버지는 강인한 육체노동으로 증명되곤 했던 남성 가부장의 권력과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바람을 ‘순수 혈통의 고대 영국인 원형’을 찾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해소한다. 순혈주의의 추구는 타자의 배척을 동반하므로 평소 아내와 딸을 상대로 가부장의 권력과 폭력을 맘껏 휘둘렀던 실비의 아버지는 선사시대를 고스란히 재연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의 수위를 높인다. 실비는 어느새 그런 폭력과 학대에 점점 익숙해지고 어머니도 ‘인생이 다 그렇지’라는 말로 학대당하는 딸을 외면한다. 아버지는 습지대에서 발견되곤 하는 미라에 관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인간을 희생양으로 바쳤던 고대의 주술 의식을 재연하기에 이른다. 물론 그가 염두에 둔 희생양은 자신의 딸 실비다. ‘유령의 벽’은 잉글랜드 북부의 어느 부족이 로마군에 저항하기 위해 선조의 유해를 매달아 전시했던 벽을 말한다. 군사상 실용적인 목적보다 내부 결속과 외부 적을 향한 대항의 의미가 더 컸을 이 벽은 오늘날 브렉시트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세우겠다고 공표했던 벽을 떠올리기도 한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주도권과 권위를 다투며 갈등했던 아버지와 슬레이드 교수는 유령의 벽을 재연하는 일에 의기투합하고 다른 이들은 실비를 희생양으로 세우는 광기 어린 행위를 옆에서 거들거나 모른 척한다. 이 일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실비를 구하려고 나서는 유일한 사람은 또 다른 젊은 여성 몰리다. 몰리는 캠프가 진행되는 내내 솔직한 발언과 거침없는 일탈 행동으로 실비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몰리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고자 몰래 캠프 밖으로 빠져나가 상점가로 향하기도 하지만 사실 소설 속에서 가장 문명에 가까운 모습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몰리의 행동이다. 소설가, 번역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당신의 숄과 나의 숄은 달라요 [책&생각] 당신의 숄과 나의 숄은 달라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25640308_2023122850373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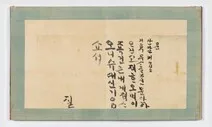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40.webp)
![[꽁트] 마지막 변신 [꽁트] 마지막 변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2223.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