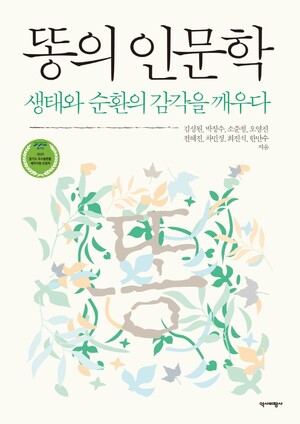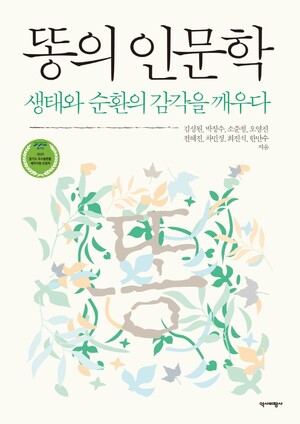똥의 인문학
생태와 순환의 감각을 깨우다
김성원 외 7명 지음 l 역사비평사 l 1만5000원
우리도, 한때 똥에 환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뽕~’과 ‘뿌지직’의 차이를 귀 기울여 포착하던 시절, 똥과 방귀 얘기만 나와도 깔깔거리던 시절, 똥의 굵기와 모양을 유심히 관찰하며 뿌듯해하던 시절. 아직 ‘대변’이나 ‘분뇨’라는 단어를 익히기 전, 똥에 온전히 마음을 열었던 어린 시절 말이다.
똥이 귀한 시대도 있었다. 비료공장이 생겨나기 전 1960년대 초반만 해도 화학비료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농민들은 땅의 영양제를 오로지 똥오줌에 의존했다. 도시의 똥과 오줌을 유료 수거해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면 갖가지 로비를 벌여 정부의 허가권을 따내야 했다. 똥보다 구린 부패의 냄새에 사람들은 코를 쥐어 쌌다.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사이언스월든팀(책임자 조재원 교수)이 진행한 학술 행사의 성과물을 다듬어 묶은 <똥의 인문학>은 똥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생태적 의미를 짚는 것은 물론, 인류 문명의 전환 가능성까지 소개하는 야심 찬 책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꿈꿨던 이상향 ‘월든’과 ‘과학’을 결합한 작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사이언스월든팀은 인류가 처한 불평등과 생태 위기, 즉 ‘쌍둥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공학적 지혜를 발휘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가령, 변기에 눈 똥이 진공펌프로 발효탱크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비비변기 시스템’을 만들고, 재활용된 똥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똥을 누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똥 기본소득, ‘똥본위 화폐’를 주장하는 식이다. 한마디로 똥의 재처리, 재사회화를 통해 ‘똥값’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이다.
사이언스월든팀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똥과 조응하는 동사는 ‘싸다’가 아니라 ‘누다’가 돼야 한다. 단지 배설하는 ‘싸질러 버리다’가 아니라, ‘누다’라는 보다 격이 높은 단어를 사용하면, 세상의 물질이 돌고 도는 열린 순환의 이치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다. ‘누다’에 덧붙여 필요한 동사는 ‘트다’이다. 서먹서먹한 사이를 친숙하게 만드는 ‘말을 트다’처럼, 똥을 트면 똥에 대한 혐오를 버릴 수 있다. 똥의 가치를 재발견하면, 식탁 위에서 똥을 입에 올려도 눈살 찌푸릴 일이 줄어들 것이다.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선 식수보다 똥오줌 처리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한다. 아무리 현명함을 뽐내는 호모사피엔스도 결국엔 ‘똥 누는 자’라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문명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그 많은 똥을 되찾아오는 일. 시급하다.
이주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