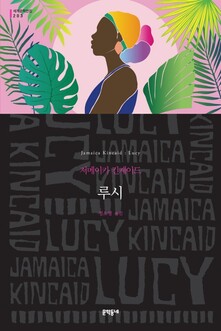
저메이카 킨케이드 지음, 정소영 옮김 l 문학동네 l 1만2000원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성취였다. 그걸 이루려 애만 쓰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피식민자, 여성, 흑인, 이주민의 정체성으로 강렬하고 시적인 소설을 써온 저메이카 킨케이드의 자전소설 <루시>가 국내 처음 번역 출간됐다.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 꼽혀온 킨케이드는 영국 연방 내 독립국인 앤티가 섬 출신이며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이다. 17살이던 1966년 모국을 떠나 뉴욕으로 갔다. 외국인 입주 보모로 일하면서 야간에 학업을 이어갔는데, 그 시절의 체험이 <루시>의 바탕을 이룬다. ‘나’는 19살에 집을 떠난다. 버린 것이다. “가정교육이라고 해봤자 난잡한 여자로 자라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전부”였던 엄마, 나와는 달리 남동생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바라는 아빠, 그런 남동생 셋. “가족이란 결국 내 삶의 목덜미에 맷돌처럼 매달린 사람들 아니던가?” 미국 중산층 가정의 “식모 방”에서 나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간다. 나를 고용한 미국인 부부를 통해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허름한 민낯을 마주하는 1년이 시간적 배경이다. ‘머라이어’ 부인은 나를 “엄마처럼” 아껴주지만 그의 ‘선량한 차별’은 나를 자주 아연하게 만든다. 가령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내게 미국 원주민 피가 흐른다”는 말을 꺼낼 때. “대체 어떻게 정복자가 동시에 피정복자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 <루시>를 비롯해 킨케이드 소설은 ‘말대꾸 형태로 응답’ 하는 서술이 특징이다. 이런 되받아치기는 첫째, 그 자체로 저항이며 둘째, 힘의 불균형을 간파하는 날카로운 도구가 된다. “원주민의 피”나 인종의 구분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있는 집단이 있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힘없는 집단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흑인이나 백인 같은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

저메이카 킨케이드. 문학동네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