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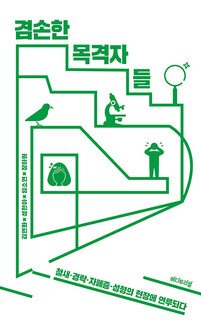
철새·경락·자폐증·성형의 현장에 연루되다
김연화·성한아·임소연·장하원 지음 l 에디토리얼 l 1만7000원 지식의 세계에도 ‘부족’이 있다. 과학자 부족, 사회학자 부족, 역사학자 부족 등. 부족원들은 정해진 영역에서 각자의 지식을 생산한다. 한편, 경계를 넘어 인문사회과학의 방법으로 과학기술 현장과 행위자(인간과 비인간)를 연구하는 ‘과학기술학자’ 부족도 있다. 도나 해러웨이, 브뤼노 라투르가 대표적이다. <겸손한 목격자들>은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에서 공부한 과학기술학자들의 기록이다. 현장에 스며들고, 때론 불화하면서 써낸 ‘겸손한 목격담’이랄까. 김연화는 한의학물리실험실을 택했다. 경락의 ‘과학적 명칭’인 ‘봉한관’(프리모관)을 연구하는 실험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곤경을 발견한다. 북한 생물학자 이봉한이 제기한 봉한학설은 “과학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과학, 한/의학을 나누는 경계에서 연구자는 “미지의 것을 현대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가 바로 과학”이라고 눌러 쓴다. 성한아는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현장을 찾았다. 겨울 철새도래지에서 조사원들은 하루 만에 금강호에서만 총 48종 35만5499개체를 기록했다. 조사원의 해박한 지식, 단련된 신체감각을 보며 그는 해러웨이가 개념화한 ‘응답 능력’을 떠올린다. 현장연구 이후 그는 새를 인간과 무관한 ‘자연’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아이의 자폐증상에 대해 공부하는 엄마들을 만난 장하원은 진료실 바깥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명칭과 ‘전형적인 자폐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다. 고군분투하는 ‘전사 엄마’의 전형 또한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비난·죄책감을 낳기 쉬운 것이었다. 엄마들은 각자 다른 자폐증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었다. 임소연은 35개월 동안 성형외과에서 ‘살아 있는 성형 수술’을 보았다. 그는 이 수술이 한국의 성형문화와 시장논리에 의해 변질된 과학/의학/기술이라면서도 과연 다른 분야는 얼마나 다른지 되묻는다. 살아 있는 과학기술과 의료는 “선과 악, 순수와 타락, 숭고와 세속이 뒤섞인 존재”에 가까웠다. 과학기술 지식이 만들어지는 장소 안으로 들어가 대화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인지라 이들의 성과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인류학적 연구와 겹치기도 하지만 서로 보지 못하는 지점이 있기에 각각의 연구와 교류는 필요하다. 책 제목 자체가 해러웨이를 향한 오마주의 성격이 있는데다, 그가 말한 ‘상황적 지식’은 연구자들의 무기였다. 이 지식은 절대적 진리나 ‘대문자 과학’의 말씀이 아니다. 모든 지식은 부분적이고 상황적이기 때문이다. 지은이들은 곳곳의 이분법과 싸우며 한국에서, 여성 과학기술학자로서 라투르나 해러웨이도 할 수 없는 연구를 해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