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적 수필집 <틈새에 박혀 있대, 살만한 이유가>를 펴낸 조명자씨. 사진 조명자씨 제공
“거칠고 남루한 한 생을 수다 떨듯 기록한 잡글을 책으로….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최근 수필집 <틈새에 박혀 있대, 살만한 이유가>(심미안)를 펴낸 조명자(67)씨는 지난 2일 통화에서 “감개무량하네요. 다 뱉어내니 회한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책엔 노조 활동을 했던 그가 민주화운동을 하던 남편을 만나 운동가 가족들과 함께 투쟁하면서도 자녀들을 키우고자 녹용과 숙녀복을 파는 ‘방물장수’까지 했던 ‘삶’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1990년대 중반 유방암에 걸린 조씨는 “춥고 외로울 내 아이들에게 엄마의 흔적이라도 남겨 주고 싶어”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의 ‘사는 이야기’(2003~11년)에 틈틈이 글을 올리기도 했고, 최근까지 페이스북에도 생각을 적었다.
솔직 담백하면서도 해학적인 그의 글에 마음을 빼앗긴 지인들이 책을 내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웃어넘겼다. ‘5·18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 윤한봉 선생의 아내 신소하씨와 이영선·최은순씨 등 후배 3명이 “글이 아깝다”며 조씨를 설득했다. “비매품으로 책을 내겠다”는 조건을 다는 바람에 이번엔 조씨가 졌다. 황광우 작가가 책 다섯권 분량의 글 더미를 뒤져 글 55편을 선별했다. 황 작가는 “‘40년 전 그 남자아이가 생각난 하루’는 그야말로 황순원의 <소나기> 뺨치는 수기”라고 적었다.
조명자씨의 글을 묶어 낸 <틈새가 박혀 있대, 살만한 이유가> 표지. 사진 심미안 제공
‘나의 여공 일기’(4편)는 1973년 봄, “전봇대에 붙은 모집공고”를 보고 ‘민성전자’에 취업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여고 1·2학년 때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 다니는 처지”에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전자계산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미스 조’는 노조 부분회장으로 활동하며 외부에서 노동자 교육을 받았다. “처음으로 내 능력을 인정해 준 언니(최영희)”가 차린 석탑출판사에서 <노동법 해설> 등의 책을 내는 일을 하면서 사람과의 인연도 확장됐다. “외모·학력·가난이라는 3대 열등감이 늘 따라 다녔는데, 노조 활동을 시작하고 ‘그래, 나 공순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점차 자존감을 찾게 됐어요.”
조씨의 남편 김희택(70)씨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을 지낸 운동가였다. 남편의 운동권 후배 한명이 조씨에게 “전공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내 전공? 납땜과지…”라고 말했다. “예에~? 행수님(형수님) 공대 나오셨능교?”라고 묻던 후배에게 그는 “으이구~공대는 무슨. 전자공장에서 납땜 부서에 있었단 말이지”라고 웃어넘겼다.
운동가의 아내는 함께 ‘투사’였던 시절도 있었다. 1983년 그와 결혼한 남편은 민청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건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렀다. 조씨는 인재근·박문숙·최정순·김설이·이기연·이경은·이미영 등 운동가의 아내들이 모인 ‘민청련 여자들’과 합심해 1985년 12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창립에 힘을 보탰다. ‘남영동의 추억’이라는 글엔 1986년 7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던 무서운 그곳”을 혼자 쳐들어가 “내 남편 내놔라”고 악을 썼던 ‘사건’의 전말도 실려 있다.
70년대 전자공장 취업해 노조활동
석탑 ‘노동법 해설’ 출간에도 참여
남편 김희택 전 민청련 의장 옥고로
‘민청련 여자들’과 민가협 창립 주도
90년대 중반 암 투병하며 글쓰기
황광우 작가 55편 선별해 책으로
1986년 3월 민청련 6차 총회 때 선출된 중앙위원들. 1. 김희택 의장 2. 박우섭 3. 최민화 4. 김병곤 5. 이범영 6.윤여연. 사진 민청련동지회 누리집 갈무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병을 얻어 먼저 떠난 동지들을 생각할 때면 그는 가슴이 미어진다. 광명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김병곤·김희택·이범영 가족은 ‘철산 민청련 3인방’으로 불렸다. 조씨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 그래서 김병곤(1953~90)이 더 그립다”고 적었다. 아내와 딸들 가슴에 눈물을 남기고 떠난 이범영(1954~94)은 “워낙 꼿꼿해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다. “그분들 기일 때 되면 제 글을 찾아 들춰봐요. 그리워서요. 제 마음을 담아 글을 썼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야기도 뭉클하다. “민주화운동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초등학교 친구한테 “지금 우리 아빠 감옥에 계신다”고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로 큰딸은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1991년 범민련 결성을 주도하다 구속된 남편 특별면회를 갔을 때, 다섯살이었던 아들은 교도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아빠, 빨리 탈출해!”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그 아들은 한때 공황장애로 고생하다가 지금은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다. 조씨는 “무던하고 말수가 없는 남편이 아들이 아프니까 ‘그간 무관심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더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내내 도시에서 그는 지금 ‘전라도 시골살이’에 푹 빠져 있다. 1996년 남편의 고향 광주로 왔다가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까만 기와집’으로 튀었다. 2년 전 면소재지로 이사한 뒤 부딪혔던 옆집 할머니(74)가 마을에서 가장 친한 ‘언니’가 됐다. 10년 만에 유방암의 공포에서 벗어났는가 했더니, 2년 전 간암이 발병해 두 차례나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다. 하지만 그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규민·호민, 아들·딸·사위 호위 속에 희희낙락 노년을 즐기는 중”이다. “데면데면한 성격”이지만, 지인들에게 “밥 먹으러 와라”고 초대해 ‘시골밥상’을 차리는 게 기쁨이다.
조씨는 “나 사는 걸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지인들이 많다”고 했다. “주변에서 저 사는 것을 보고, 박복하다고 하고, 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삶의 풍상 사이사이(틈새)에 참 많은 행복과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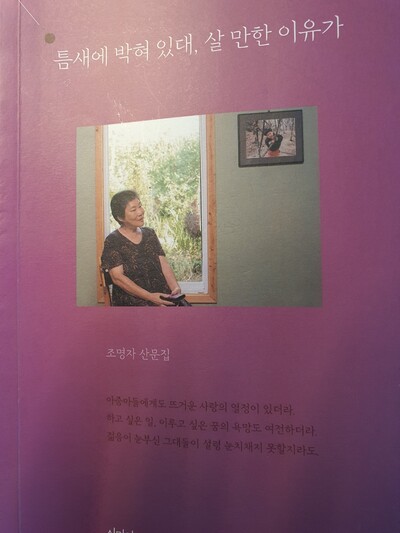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