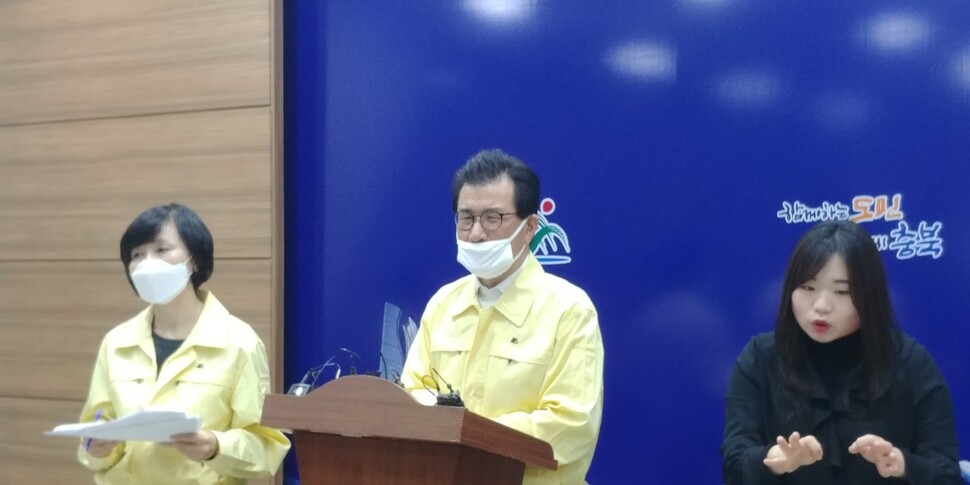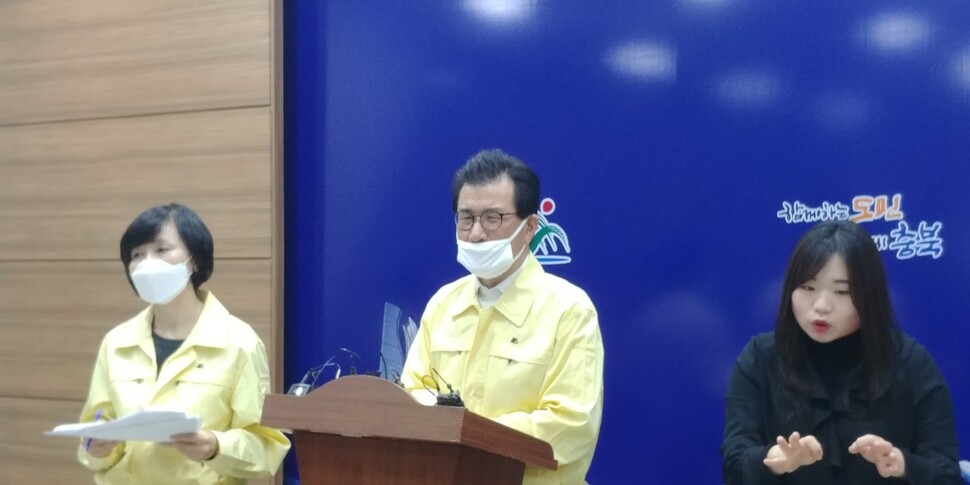이시종 충북지사(가운데)가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미국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확진 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병원, 식당 등을 두루 다닌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6일 충북도 등의 발표를 종합하면, 증평군 박아무개(60)씨는 지난 25일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증평군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박씨는 지난 2일 출국해 미국 뉴욕에 사는 딸을 만나고 지난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씨는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다고 했지만, 다음날부터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날 오전 9시10분께 증평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박씨에게 외출 자제 등을 알리는 보건 교육을 한 뒤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정부는 유럽 입국자는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처했지만, 당시 미국 입국자는 권고에 그쳤다.
그러나 박씨는 권고를 무시하고, 25일 오전 증평 지역 은행·우체국·농협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청주로 이동해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까지 들렀다. 청주 중심가 식당, 상점 등을 거쳐 증평 지역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까지 방문했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박씨가 자가 권고를 여기고 다중 이용 시설을 두루 들린 터라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다중 이용 시설을 두루 방문해 접촉자를 늘리고, 감염 확산 위험성을 높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미국 입국자는 27일 0시부터 2주간 의무 자가격리가 적용돼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던 박씨에게 법적·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와 함께 출국했다가 지난 17일 먼저 입국한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