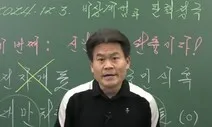전진식 사회2부 기자
2007년 3월, 소설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바람이 그의 얼굴 주름을 더 깊이 훑었다. 군중은 쭈그려 앉았고, 그는 서서 그들을 목격했다. 그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 1300여명이 가득했다. “지금의 시위는 빈손으로 남은 농민이 가을 들판에 불을 지르는 ‘모불’ 시위”(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라는 문장을 취재수첩에 휘갈기는 사이 소설가는 사라졌다. 허둥대는 사회부 말단 기자는 그를 더 찾지 못했다. 꽃샘바람에 곱은 손으로 말들을 적느라고 허덕일 뿐이었다. 그는 압정처럼 박힌 군중들을 응시하고 또다른 눈인 카메라로 기록했을 것이다. 시대의 사건을 방관하지 않으려는 자, 현장을 찾는다. 그리고 방관자가 아닌 목격자가 된다. 1978년 연작소설 12편을 예뻐서 더 슬픈 표지에 묶어 펴낸 이, 그는 소설가 조세희 선생이었다.
기자와 쓰레기를 덧셈해서 기레기라는 낱말이 연산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시절, 선생의 이런 문장을 읽었다. “나는, 잘 써야 하기 때문에 못 쓰고 있다. 우리 시대는 힘든 시대이고, 그 시대를 문장으로 축소할 만큼 충분히 이해해야 글은 쓰여지는 것이다.” 이 문장을 옥탑방 책상머리에 써붙이고 공부했고 그해 신문기자가 됐다. 잘 쓰는 게 무엇인지 몰랐으므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사를 쓰다 날이 저물고 달이 가고 해가 기울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 기레기라는 말이 머리빡을 때렸다. 팽목항에는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진도 체육관은 텔레비전으로만 보았으며,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는 신문기사에서만 읽었으니 기자가 아니라 방관자일 뿐이라는 따귀도 맞았다. 4월 한창이었는데 짓궂은 날씨가 목련을 땅바닥에 모조리 내팽개친 뒤였다. 사리 때 물살보다 빠르게 쏟아지던 기사가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기자들의 반성문이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대기업이 군사정권 시절 만든 신문은 더 살뜰하게 반성하는 하루치 신문을 만들기도 했다.
사마천의 <사기> 한 대목이 생각난 것도 그즈음일 것이다. 그 책 ‘열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반청지위총 내시지위명”(反聽之謂聰 內視之謂明) 들은 것을 거듭 되새기는 것을 귀가 밝다(총) 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눈이 밝다(명) 한다는 뜻이다. 총명이라는 낱말이 여기서 나왔고, 기자로서 새길 말이라고 여겼다. 세상은 총명한 기자를 원하고 있었다. 총명한 기자는 가까이에도 있었다. 선생이 1970년대 재개발 지역 동네 곧 철거될 세입자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철퇴로 대문과 시멘트담이 무너져버리는 것을 목격한 뒤 작은 노트에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듯이, 굴착기 삽날로 파헤쳐지는 4대강 사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기록했던 한 시민기자는, 4대강 사업이란 낱말조차 신문·방송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금, 더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의 낭떠러지에 내몰려 있다.
올봄처럼 목격자가 슬프고 방관자가 괴로운 시절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하는 ‘불꽃의 말’이 넘실대는데, 나서지 않고 곁불만 쬐었으니 누가 봐도 방관이었다. 그래서 선생을 다시 불러낸 것일 테다. 그 소설을 2000년에 다시 펴내면서 선생은 적었다. “혁명이 필요할 때 우리는 혁명을 겪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지 못하고 있다.”
2014년 4월16일, 한 세월이 가라앉았다. 우리는 그것의 목격자이다. 사십구재를 어제 보낸 우리는, 그리고 오늘 유권자이다. 전진식 사회2부 기자 seek1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나의 전셋집 순례기 [한겨레 프리즘] 나의 전셋집 순례기 [한겨레 프리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4015243451_2024011650353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