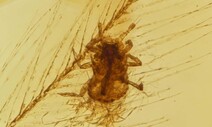공룡 친척의 똥 속에서 돌로 굳은 이 원시 딱정벌레는 2억년 동안 타임캡슐로 보존됐다가 첨단 분석기술에 힘입어 모습을 드러냈다. 크바른스트룀 외 (2021) ‘커런트 바이올로지’ 제공.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인 2억3000만년 전 지금의 폴란드 남부의 습지에 공룡 사촌뻘인 실레사우루스가 부드러운 녹조류와 커다란 딱정벌레를 잡아먹고 있었다. 녹조와 함께 삼킨 원시 딱정벌레는 작은 몸집 덕분에 온전히 배설물과 함께 배출됐고 화석으로 굳었다.
공룡 뼈가 나온 지층에서 발굴된 ‘똥 화석’(분석)에서 지금은 멸종한 원시 딱정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돌덩이로 굳은 화석 내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3차원 투과기술 덕분에 공룡시대의 먹이그물 등 옛 생태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똥 화석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실레사우루스 상상도. 폴란드에서 발견된 공룡형류로, 실레사우루스와 공룡은 공통의 조상인 고대 파충류에서 갈라져 진화했다. 마고자타 차야 제공.
마틴 크바른스트룀 스웨덴 웁살라대 고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1일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린 논문에서 더듬이와 다리까지 온전히 보존된 원시 딱정벌레를 공룡과 가까운 친척인 공룡형류 배설물 화석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는 딱정벌레가 처음 진화해 다양화한 시기이지만 당시의 곤충 화석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딱정벌레는 현재 알려진 전체 생물종의 25%, 곤충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가장 다양한 생물군이다. 연구에 참여한 마르틴 피카체크 대만 중산대 곤충학자는 “트라이아스기 곤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까지 알 수 없었다”며 “더 많은 똥 화석을 조사하면 잘 보전된 곤충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이 폴란드 남부 카치오의 채석장에서 발견한 분석은 길이 1.7㎝ 지름 2.1㎝의 작은 원통형 돌덩이였다. 돌덩이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엑스선 단층촬영 기법이었다.
엑스선 단층촬영으로 들여다본 똥 화석 내부. 수많은 곤충 몸 조각과 균류(또는 조류) 조각이 흩어져 있다. 크바른스트룀 외 (2021) ‘커런트 바이올로지’ 제공.
똥 화석 안에는 거의 완벽하게 형태를 갖춘 길이 1.5㎜의 작은 딱정벌레 한 마리와 수많은 같은 종 딱정벌레 조각, 그리고 머리와 겉날개 등 일부만 남은 더 큰 딱정벌레의 몸 일부와 곰팡이나 조류의 조각 등이 들어있었다. 똥 화석과 같은 시기의 지층에서는 공룡형류인 실레사우루스 화석이 발굴돼 배설의 주인공으로 추정됐다. 실레사우루스와 공룡은 공통의 조상인 고대 파충류에서 갈라져 진화했으며 길이 2m 무게 15㎏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딱정벌레는 지금은 멸종한 새로운 과로 분류됐으며 가까운 친척인 현생 식균 아목 딱정벌레가 습지에서 조류를 먹고 사는데 비춰 당시에도 물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 저자인 크바른스트룀 박사는 “실레사우루스가 다수의 원시 딱정벌레를 먹었지만 워낙 크기가 작아 표적으로 삼은 먹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같은 서식지에 살던 더 큰 딱정벌레가 잔해로 남아있고 소화돼 사라진 다른 먹이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 파충류는 잡식성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똥 화석에서 발견된 많은 다양한 원시 딱정벌레. 새로운 과로 분류됐다. 크바른스트룀 외 (2021) ‘커런트 바이올로지’ 제공.
딱딱한 뼈대가 없는 곤충은 화석으로 남기 힘들다. 지금까지 고대 곤충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길은 나뭇진이 굳은 광물인 호박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호박이 산출되는 곳이 한정된 데다 가장 오래된 호박 속 곤충이 1억4000만년 전에 그쳐 그 이전 모습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엔 호박의 주산지인 미얀마 북부 카친 주의 후광 계곡이 국제 분쟁지역인 데다 인권과 밀수 문제가 얽혀 있어 이곳 호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는 지적이 고생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나뭇진이 굳은 호박은 온전한 모습의 곤충, 개구리, 새, 공룡 등을 간직해 당시의 생태를 짐작할 유력한 연구대상이지만 분포지역과 시기가 한정돼 있고 최근엔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안더스 담고,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그러나 중생대 똥 화석은 비교적 흔하게 산출돼 당시의 곤충을 연구하는데 호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바른스트룀 박사는 “똥 화석의 인산화 칼슘 성분과 배설 직후 세균에 의한 광물화 과정이 정교한 화석으로 보존되도록 해 준 것 같다“며 “단층촬영 화면의 곤충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잘 보존돼 있었다”고 말했다.
인용 논문:
Current Biology, DOI: 10.1016/j.cub.2021.05.01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